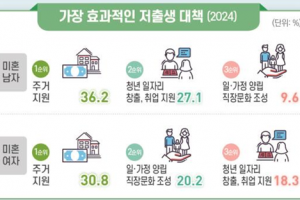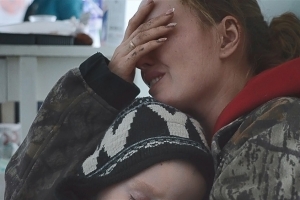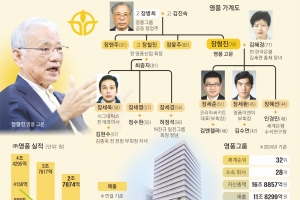군사당국 접촉에서 ‘의제·격’ 놓고도 기싸움
수정 2014-10-17 10:50
입력 2014-10-17 00:00
北 “어선 단속 함정에 표식달자”…南 “군사당국 직통전화 필요”
북측은 16일 조선중앙통신사 공개보도 형식을 취한 접촉의 ‘전말’에서 서해 예민한 수역과 예민한 선을 넘지 않는 문제와 고의적 적대행위가 아니면 선(先) 공격 말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교전수칙을 수정하고, 불법 조업 어선 단속을 위해 양측 함정에 약속된 표식을 달아 우발적 총격을 막자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북측의 제안은 우리 측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고수 입장에 반박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논리로 풀이되고 있다.
북측이 주장한 ‘예민한 선’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경비계선을 말한다. NLL 아래쪽으로, 서해 5도 위쪽 해상으로 지정한 경비계선은 NLL과 대척점을 이루는 개념이다.
우리 측의 경고통신, 경고사격, 격파사격으로 이뤄진 교전수칙을 수정하자는 제안도 기싸움의 성격이 짙다. 이는 NLL과 북측이 주장한 경비계선 사이로 진입하는 북측 함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제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어선 단속을 위한 양측 함정에 약속된 표식을 달아 우발적인 총격을 막자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약속된 표식을 단 북측 함정이 NLL을 침범해도 경고사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이런 제안은 NLL을 무실화,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에 우리 측은 “북측이 NLL 준수, 존중하면 우발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논리로 맞섰다고 한다.
더욱이 양측 함정에 약속된 표식을 달기보다는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와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 당국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용을 역제의했다고 한다. 북측은 이 제안에 대해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측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특성상 표현의 자유도 억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측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살포를 금지해 달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양측은 의제 뿐 아니라 회담 대표의 격(格)을 놓고도 신경전을 펼쳤다.
북한은 전날 중앙통신을 통해 군사당국 접촉과 관련 “우리가 요구한 국가안보실 실장이 아닌 아무런 권능도 없는 한갓 국방부 정책실장을 대신 내보내겠다고 한 것은 우리가 특사급을 낮추거나 급수 또는 격을 놓고 시비를 걸게 만들어 긴급접촉자체를 지연시키거나 완전히 무산시켜보려는 교활한 속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남측이 이번 긴급접촉에 아무러한 결론권도 없는 국방부 정책실장을 내보낸 것 자체가 북남대화에 대한 일종의 우롱이고 모독”이라고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책임을 남측에 전가했다.
북한은 보도문에서 자신들이 내세운 수석대표가 누구인지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정부는 “북측이 7일 통지문에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특사로 나올 것이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의 판문점 접촉을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내세워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내려 했지만, 정부가 이에 반대해 결국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의 접촉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남북은 과거에도 회담 대표의 격을 둘러싸고 종종 신경전을 벌여왔다.
지난해 6월 남북당국회담 추진 당시 정부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통보했고 이에 정부가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내세우자 회담은 결국 무산됐다.
2011년 2월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국방장관과 북측의 인민무력부장 또는 합참의장(대장)과 북측의 총참모장(차수)으로 할 것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이보다 낮은 인민무력부 부부장 또는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하자고 주장해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