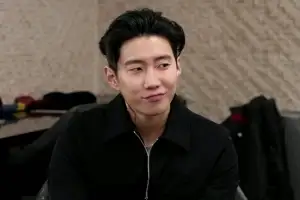[WBC] 김인식 “이게 마지막인데…너무 가슴이 아파”
수정 2017-03-08 14:13
입력 2017-03-08 14:12
기억에 남을 경기로 2009년 WBC 결승과 이번 대회 이스라엘전 꼽아
“2회 WBC (결승)에서 그렇게 된 거 하고, 또 하나 이번 이스라엘전이 가장 기억에 남을 거 같아.”
연합뉴스
김인식(70) 감독이 이끄는 한국 WBC 대표팀은 6일 이스라엘과 7일 네덜란드전에 연거푸 패해 조별 예선 탈락 위기에 놓였다.
아직 9일 대만전과 산술적인 2라운드 통과 가능성이 남았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 감독은 대표팀 훈련을 위해 8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을 찾아 “이게 (국가대표 감독으로) 마지막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대회는 끝나지 않았지만, 김 감독은 무언가 예고라도 하는 것처럼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2006년 김 감독은 초대 WBC 대표팀 감독을 맡아 ‘4강 신화’를 썼고, 2009년 2회 대회 때는 준우승에 올라 한국 야구 위상을 한껏 높였다.
이후 KBO리그 우승팀 감독이 대표팀까지 맡는다는 규정이 생기며 김 감독은 잠시 현장을 떠났지만, 2015년 프리미어 12 때 복귀해 팀을 정상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김 감독에게 붙은 별명도 ‘국민 감독’이다.
한국 야구 영광의 순간에 김 감독도 꾸준히 함께했지만, 이번 WBC는 사실상 최악의 대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돌이켜보니 이긴 경기보다 패한 경기가 더 생각난다는 김 감독은 2009년 WBC 일본과 결승전을 가장 아쉬워했다.
당시 한국은 9회말 2사 후 이범호의 극적인 동점타로 경기를 연장까지 끌고 갔지만, 연장 10회초 이치로 스즈키에게 결승타를 내주고 말았다.
김 감독은 “이번 이스라엘전도 별생각이 다 든다”면서 “딱 하나(1점)만 들어왔다면 달라졌을 텐데, 자꾸 ‘이러면 어땠을까’하는 생각만 난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한국은 1라운드 통과의 분수령이었던 이스라엘전에서 타선 침묵 속에 1-2로 졌다.
그래도 김 감독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어쨌든 이 모든 게 감독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이제 김 감독은 9일 대만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원한다.
대표팀에 부상 선수가 많지만, 김 감독은 “조금씩 아프더라도 마지막 경기니 나와야 할 것 같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